|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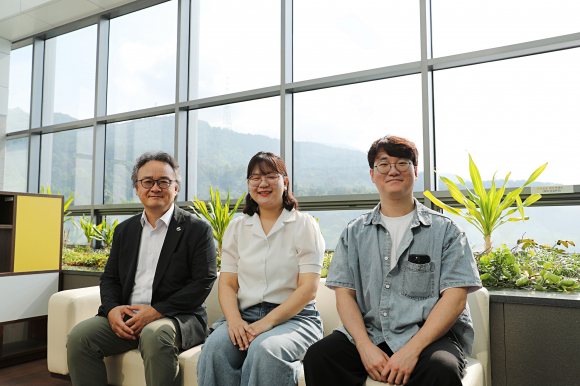 |
|
| ↑↑ 왼쪽부터 DGIST 에너지공학과 이종수 교수와 이남지 석박사통합과정생, 최동현 박사과정생. DGIST 제공 |
|
DGIST(총장 이건우) 에너지공학과 이종수 교수 연구팀이 포토레지스트(감광막)를 사용하지 않고 빛만으로 양자점(Quantum Dot, QD)을 초고해상도로 패터닝하는 직접 광리소그래피(Direct Optical Lithography, DOL)기술을 개발했다.
그리고 이를 통해 고성능 QLED 제작에 필요한 크로스링커(cross-linker) 선택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. 이번 성과는 마이크로 QLED,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, 투명 전자소자, 차세대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광전자소자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로 평가받고 있다.
양 자점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수준인 초미세 반도체 입자로, 크기에 따라 발광 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색 재현력이 뛰어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다. 그러나 기존 포토레지스트 기반 패터닝 공정은 복잡한 절차, 발광 성능 저하, 패턴 변형 등 한계가 있었고, 잉크젯 프린팅이나 마이크로콘택트 프린팅 역시 해상도와 정밀도에서 제약이 있었다.
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외선(i-line, 365 nm)에 반응하는 디아지린(diazirine) 기반 크로스링커 TDBA를 도입했다. TDBA는 양자점 표면에 직접 결합할 수 있는 '카복실산 작용기'와 빛에 반응하는 '디아지린 구조'를 모두 갖추고 있어, 빛 조사 한 번으로 양자점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며 초미세 패턴을 형성한다. 이를 통해 약 2 μm(6,350 DPI) 수준의 초고해상도 패턴 구현에 성공했으며, 뛰어난 정밀도와 안정성도 확보했다.
패터닝 후 'PETMP'라는 티올(thiol) 기반 물질로 후처리해 양자점 표면 결함을 패시베이션(passivation)함으로써 양자효율(PLQY)을 추가로 향상시켰다. 이 과정을 거친 양자점을 발광층으로 적용한 QLED 소자는 최대 외부양자효율 10.3%, 최대 휘도 99,369 cd/m²라는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으며, R/G/B 양자점을 활용한 반투명 QLED에서도 양면 발광이 가능함을 입증해 투명 디스플레이 응용 가능성도 열었다.
연구팀은 제작 기술 개발에 더해, 크로스링커의 분자 구조가 양자점 발광 및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. 양자역학 계산 기법인 밀도범함수 이론(DFT)을 활용해 황(S) 원자를 포함한 TBBT와 황이 없는 BPDT를 비교한 결과, BPDT가 더 높은 전도성을 나타내어 QLED 성능 향상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. 이는 향후 고해상도·고성능 양자점 디스플레이 제작에 최적의 소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.
이종수 교수는 “이번 연구는 단순히 해상도를 높인 것을 넘어, 양자점의 고유한 발광 특성과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과 소재 선택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”며, “AR·VR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"”이라고 말했다.
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, 양자점 전문기업 DCT(대표 정한일),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채원식 박사팀이 공동 참여했다. 연구 성과는 재료화학 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 Nano Letters(IF 9.1)와 ACS Nano(IF 16.0)에 각각 게재됐다. |